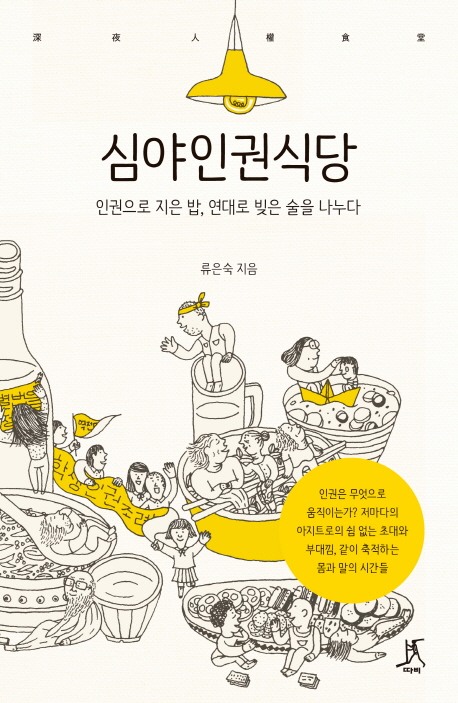
심야인권식당
인권으로 지은 밥, 연대로 빚은 술을 나누다
류은숙 저 / 따비 / 2015 / 정리 :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독서모임의 백미는 소위 말하는 ‘뒷풀이’다. 술집으로 옮겨진 2차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꽃을 피운다. 그래서인지 아예 ‘뒷풀이’만 집중적으로 참여하려는 문제회원도 있을 정도이다.
이번 달 독서모임을 준비하며 저자를 흉내 내고 싶어졌다. 사실 술이라면 우리도 좀 자신 있었기 때문이다. 나름 음식을 준비하고 독서모임을 시작하려는데 처음부터 시련이 찾아왔다. 모임날짜가 하필이면 7월 26일, 중복을 하루 앞둔 저녁인지라 엄청난 열대야에 땀이 비오듯이 내렸다. 부실한 에어콘과 삐그덕~삐그덕~ 괭음과 바람을 동시에 내놓은 선풍기를 아무리 돌려도 음식으로 인한 열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군다나 예상외로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독서모임에 참가하는 바람에 준비한 음식은 금세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래저래 저자와 같은 큰손(?)은 쉬운 일이 아님을 확인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선선한 날씨에 풍요롭게 음식장만을 하여 시즌2를 준비하겠다는 속다짐과 함께 말이다.
[책속으로~~]
p15 누구나 아지트가 필요하다
술방의 주모를 고집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일에 대한 나의 판단 때문이다. 나는 일상성에 중요한 것이 묻혀 있고 일상에서의 움직임에 중요한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먹고 마시고 치우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들이 내겐 멋진 글을 쓰고 발언을 하고 특별한 자리에 나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을 살피는 일, 대화하고 때론 불편함과 무거움을 감당하는 일은 어떤 심리학이나 정치학 이론보다 습득하기 어렵다.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장 보고 씻고 다듬고 만드는 일, 화장실부터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 이런 일에 마음이 쓰이고 몸이 가는 사람은 늘 일부다. 그리고 그 일부의 일이기에 ‘허드렛일’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허드렛일이 아니라 오래오래 익혀야 몸과 마음에 붙는 기술들로 이루어진다. 책에서 읽은 공감이나 환대가 일상에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마음먹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나는 허드렛일 취급받는 일이
정작 ‘중요한’ 일로 평가받고, 누구나 해야 하는 ‘당연한’ 일로 만드는 게 처우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p59
지금 내게 공부란 끝없는 말 배우기다. 외‘국’어가 안니 타‘인’의 말을 배운다. 특히 인권공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약자이자 타자이면서 어떤 범주로 뭉뚱거릴 수 없는 개별자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이중 삼중의 언어가 필요하다. 때론 배운 말을 부수고 버려야 한다. 말속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쳐 쓰려면 마땅한 말을 찾아야 하고, 능력에 버겁더라도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한다.
p109
노동권의 의미도 바뀌어야 한다. 임금노동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노동이 사라지는게 아니다. 고용관계에 있거나 없거나, 임금을 받거나 안 받거나, 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을 포괄하는 권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노동권의 과제다.
p157
'교육받을 권리‘를 흔히 ’학교에 갈 권리‘로 오인하고 ’더 비교우위가 있는 학교를 나올 권리‘로 오용하는 현실이다. 교육받을 권리란 자존감을 가꾸고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 몫을 발견하는 것일 텐데 말이다.
밀양전의 동력은 ‘울력’이다. ‘울력’이란 여러사람이 힘을 합해 일을 하는 걸 말한다. 품앗이 같은 거다. 밀양 할매들이 쓰는 울력의 의미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못 산다. 제아무리 잘나도 저 혼자 살 순 없다. 이웃 덕분에 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덕분에 산다’, 그런 고마움이다.
p175~176
인권운동의 사안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안이 출현하는 것은 저마다 ‘그까짓’을 붙들고 씨름해온 결과다. 그까짓 농담 한마디가 성차별일 수 있고, 그까짓 ‘살색’이라는 크레파스 색깔 이름이 인종차별일 수 있고, 그까짓 이력서 기재사항이 갖은 차별의 목록일 수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 서열을 매기려고 적당한 표식(구실)을 만들어내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과 대처가 달라질 수 있었다.
p278
이 책의 제목을 빌린 〈심야식당〉에서 나는 그런 현명한 제삼자들을 본다. 주인장이나 손님들이나 당사자들 문제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자기비하에 빠져 있는 걸 내버려두진 않는다. 반대로 누군가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을 할 때는 단호한 반응을 보인다. 없는 듯 있는 강력한 법이 거기에 있다. 그 손님들 각자는 자신만의 ‘뜨거운’ 관계로 괴로워하지만, 그런 법이 있기에 서로에게 미지근하지만 현명한 제삼자가 되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