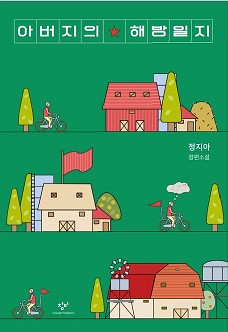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저 / 창비 2022 / 정리 / 김아리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진지 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첫 문장이다.
강렬한 이 첫 문장이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해방 후 레드콤플렉스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외침과 함께 빨갱이, 빨치산, 사회주의는 대한민국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그런데 이 ‘공-교(?)’로운 시기에 때아닌 빨치산 이야기가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 1위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책 제목은 왜 해방일지일까. 해방 전·후 사슬처럼 엮인 가족사를 다룬 책이라서? 아니면 최근 흥행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따온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일 무렵 책 좀 읽는다는 지인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해방일지 읽어 봤어?”라는 입소문이 돌았다. 책 속의 전라도 말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간 듯 마음이 푸근해져 있던 그때, 나도 모르게 1월 독서 모임 발제를 흔쾌히 수락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후회했지만.
이 책의 시공간은 아버지 장례식, 3일간이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해방에서 분단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격동의 한국 현대사 속을 떠돌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 고상욱과 얽히고설킨 인연들이 유일한 혈육인 딸 아리와 다시 인연이 되는 과정을 그린다.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로 활동했던 백아산과 지리산의 글자를 따서 만든 운명의 이름처럼. 빨치산의 딸로 살아 억울했고, 답답했고, 아버지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세월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비로소 해방을 맞이한다.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진지 일색의 삶을 마감한” 그 죽음 앞에 딸 아리가 얻은 해방은 무엇일까?
아리가 어린 시절 마주한 아버지는 사회주의자였다. 심지어 “정치적으로만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사회주의자였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서면 언제나 이런 기분이었다. 좋은 옷, 예쁜 치마, 화장품, 머리 모양, 내 또래 여자아이들의 소소한 화제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그런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게 느껴졌다. 통일과 혁명, 인류의 진보 그런 화제가 아닌 어떤 이야기도 아버지 앞에서 꺼내면 안 될 것 같았던 시절이, 꽤 긴 시절이 있었다.”
그런 아리가 묻는다. 먹지도 못할 빨간 맹감 가지를 지게에 꽂고, 수줍은 연자주빛 들국화 몇 송이를 낭창낭창 끼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언제나처럼 단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영정 속 아버지를 향해 아리의 마음이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아리는 알아간다. 처음으로 고상욱을. 그리고 아버지를.
빨치산 고상욱이 아니라, 청년 고상욱을, 아버지 고상욱을, 자신과 결이 닮은 합리주의자 고상욱을, 동네 어른 고상욱을. 그리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결을 가진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평생을 정색하고 진지 일색으로 살아온 아버지를 향한 아리의 첫걸음은 무거웠다. 그런데 아버지와 시간과 마음을 나누고 살았던 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아리의 마음이 가벼워졌다.
소설 속 눈길이 가는 또 한 인물. 바로 고상욱의 동생. 고상호. 아리의 작은 아버지이다.
노상 술에 취해있고, 부고를 전해도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고, 형의 장례식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은 그는 또 다른 시대의 아픔이다.
총을 들고 교실로 들이닥친 군인이 “고상욱이 본 사람 손들어!”하고 묻자 아홉 살 상호는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외쳤다. “우리 짝은성인디요. 문척멘당위원장잉마요.” 아홉 살 소년의 등에 총구를 겨누고 마을로 온 군인들은 배내골에 불을 놓았다. 연기에 휩싸인 마을 정자 옆 자신의 아버지의 주검 곁에서 오줌을 지린 채 혼절한 아홉 살 소년 상호. 그가 고3 여름방학에 가출한 아리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들릴락 말락 한 혼잣말로 “저 질이 암만 가도 끝나들 안해야. 한 등에 두 짐 못 지는 법인디...” 자기 등에 평생 얹혀 있었던 두 짐을 감당하지 못해 술로 세월을 보낸 이가 아리의 등에 얹힌 두 짐을 보고 따라나선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혈육인 아리보다 고상욱을 더 아버지처럼 모시는 학수는 어느 날 고상욱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말한다. “아부지, 먼 일 있으먼 밤이고 새복이고 전화허씨요.” 이 책에는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사정을 들여다보려 애쓰는 것이 사람임을 보여주는 오지라퍼들이 등장한다.
고상욱이 유물론자인지, 사회주의자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배내골 대표 오지라퍼임은 틀림없다. 고상욱의 십팔번은 “사램이 오죽하면 글겄냐.”이다. 고상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 이들도, 혼자인 상주 아리의 허전한 옆자리를 지킨 것도 ‘사람’이었다.
책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상한 인연 둘이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그들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나를 감쌌다.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탓인지 유골이 차츰 따스해졌다. 그게 나의 아버지, 빨치산이 아닌, 빨갱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로 끝난다.
“그 변명을 들을 아버지는 이미 갔고 나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사라졌다. 그 사실이 뼈아파 나는 처음으로 소리 내 울었다.” 나에게는 아직 변명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나의 아버지에게 고한다. “아버지 그간의 오만을. 무례를. 어리석음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길....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