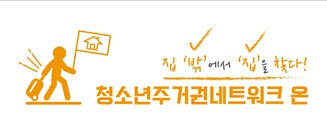
10월 첫째 주 월요일 | 세계 주거의 날
‘지옥고’를 아시나요? 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앞 글자를 따서 줄인 용어입니다. 지옥고는 대표적인 ‘비적정 주거지’입니다. 비적정 주거지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지옥고에서는 자연재해가 닥쳐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지하 집은 매년 여름마다 폭우 침수 피해뿐 아니라, 해가 잘 들지 않아 어둡고 곰팡이 같은 습기로 일상적인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고시원과 옥탑방도 화재, 폭염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하, 반지하에는 32만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수로 생각하면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도 59만 명이 넘습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곳에 살 권리
1984년 12월 10일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문은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고자 합의한 선언문으로 국가가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의무중 하나인 ‘주거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할 권리 등 다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유엔에서는 1986년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을 만들었습니다. 주거권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였습니다.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Mind the Gap:Leave no place behind”이라는 주제로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장소도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세계 주거의 날은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어서 날짜가 매번 바뀝니다. 올해 2025년은 10월 6일이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 사람이 사는 공간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유엔은 단순히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건물만 있다고 해서 주거권이 보장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내쫓기지 않고, 괴롭힘 등의 위협에서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적정한 기간만큼 살 수 있어야 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만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한국도 국민의 주거 보장을 위해 2015년에 ‘주거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가격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최저 주거 기준’이라고 불리는 규칙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은 집에 사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 주거 면적이 최소한 14제곱미터여야하고 한 개의 부엌과 화장실이 포함된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 주거 기준이 제시하는 집의 넓이가 실제 주거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음이나 환기, 채광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아 문제입니다.
# 사는(buy) 집 말고 사는(live) 집
주거권을 보장하려면 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이 이익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이웃과 함께 사람답게 사는 삶의 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는 세계 주거의 날에 ‘주거권 대행진’ 등의 ‘시민 행동’을 합니다. 주거시민단체는 올해도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여 추석을 앞둔 10월 1일, 서울역 일대에서 <2025 세계주거의 날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심각해지는 주거 불평등을 드러내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집이 모두의 권리라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 더 알아보기① –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나요?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가정 해체 등의 사유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청소년 쉼터 등이 당장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쉼터도 이들에게 영원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단기 쉼터의 경우 3개월, 중장기 쉼터도 1년 정도만 생활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일정연령이 넘으면 퇴소해야 하고, 시설 퇴소 후 적절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 종료 아동을 공공 임대 주택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②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현장과 함께 인권의 눈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하는 가운데에 현장에 비어있는 ‘주거권’이라는 의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2019년, 청소년 주거가 권리로서 이야기되고 요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청소년 지원현장, 인권단체, 법률단체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국이 꾸려지고 2022년 2월 창립하여 현재 청소년활동가를 비롯한 다양한 단위의 단체활동가, 개인활동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